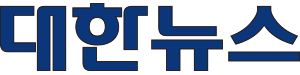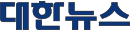옛날 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국가에서 성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다. 내성과 외성인 성곽을 쌓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문 앞에 항아리와 같은 모양의 옹성을 쌓아 지키기도 했다.
최고로 용감한 병사들이 지키던 옹성이 무너지면 성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철저하게 성을 지켰는데, 그런 일을 농성이라고 했다. 그 농성이 지금은 바뀌어 어떠한 목적을 위해 건물이나 혹은 특정된 직장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단으로 버티며 권리나 주장을 요구하는 일을 농성이라고 한다.
약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경북 영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 농성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4일 현장을 취재했다. 마침 환경미화원 관계자가 농성 현장에 있었다. 먼저 신분을 밝히고 말을 건넸다. “너무 오래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 시점부터 약 20분간 질문 없이 관계자 이야기만 들었다.
요약하면 임금 협상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근접해 있으나 환경미화원 측은 현재 받는 금액(비 공개)에서 10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영주시 관계자는 2만8000원 정도 더 줄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필자가 예단하기로 영주시가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선례를 남기면 행정 집행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사안이 유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입장이 참 난처할 것 같다.
예컨대, 약 6개월 전 불법건축물 사건으로 필자가 행정심판에 불복해 모 지방 법원에 불법건축물 관련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선고가 끝난 후 알아보니 실 건축물과 설계 도면상 약 10cm 정도밖에 편차가 나지 않으나 경미 한 사건이라 해도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판결 한 것 같다고 법원 행정부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런 것이 행정이고 민·형사 법이다. 영주시 공무원재량권이 있어도 남용할 수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행정법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식회사 영주시가 아니지 않나. 개인 같으면 박남서 시장이 불러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 내가 더 얹어 줄게 열심히 하자, 하면 끝나는데, 안타까울 뿐이다.
환경미화원 대표자로부터 핵심적 이야기와 영주시 관계자 입장으로 본 문제점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들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쌍방내용은 적시할 수 없으나 특히, “공무직이라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 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영주시 대내외적 이미지도 있고, 웬만하면 지역사회에서 다시 안 볼 사람들도 아니며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어떤지 간곡히 청원해본다.
대다수 지방시·군 경우 정부 예산(교부금 포함) 약 80%이며, 나머지 약 20%가 지방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남서 시장 쌈짓돈 아닌 것은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또, 영주시 1천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최선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과 폄훼는 봉합하고 미래를 향한 시그널로 돌아서는 모습을 시민들은 갈망할 것이다. 언론은 때에 따라 중재도 할 수 있고 갈등의 골이 깊으면 화해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우리네 가정도 남편이 너무 완벽하면 마누라는 재미가 없다. 남편이 한잔하고 들어와 지갑도 좀 열어 놓고 자야 마누라가 편하다. 다음 날 열린 지갑을 닫으면서 고개 갸우뚱하지 말고 그냥 출근하시라, 그 돈이 어디로 갔든 또 열심히 벌면 되지 않을까, 너무 완벽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좀 속을 줄도 알아야 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세상이 굴러간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이런 허점을 용납하지 않는다. 박남서 시장이 현재 두 마리 토끼을 좇아야 할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속담에 ‘엎어진 놈 꼭지 누르기, 밟힌 놈 짓뭉개기’ 하면 지역사회에서 너무 인정 없는 것 아닌가,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여유로움이 아름다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을 터이다. 부디 농성을 접고 훗날을 기약하기 바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